
[이성필기자]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52)의 별명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홈경기 시작 때는 그를 '2대8 카리스마'로 소개했다. 바람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는 그의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빗댄 말이다. 경기 전에는 온화하다가도 벤치에만 들어서면 선수들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모습이 카리스마 있게 보였다.
200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에는 청나라의 황제로 천하통일을 이뤄낸 강희제(康熙帝)를 지칭하는 '강희대제'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아시아 클럽 대회가 챔피언스리그로 통일된 뒤 K리그 클럽으로 첫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터라 대제란 칭호가 붙을 만했다.
'봉동이장'도 과거 개구리, 거북이 같은 별명이 있었다
이후 그에게는 '재활공장장'이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2006년 제칼로를 시작으로 2008년 조재진과 루이스, 2009년 성남 일화에서 퇴출당한 이동국과 김상식까지. 최강희 감독을 만난 이들은 묘하게도 재능이 살아났다. 올 시즌에는 주장 조성환을 순한 양으로 만들며 리그 정상급 수비수로 조율했다.
'봉동이장'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별명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전북의 선수단 숙소에서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가꿔 수확하는 그에게 '이장'이란 별명은 소탈한 이미지를 가져다줬다.
그런 최 감독도 현역시절에는 개구리, 독일전차, 거북이, 자라, 꾸라꾸라 등 재미있는 별명을 달고다녔다. 수비수 출신인 그는 K리그에서 205경기 출전해 10골 22도움을 기록했다. 국가대표는 늦은 나이인 28세에 발탁,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뛰었다.
최 감독은 "개구리는 그라운드 곳곳을 폴짝폴짝 뛰어다녀서 붙었던 것 같다. 독일전차도 지칠 줄 모르게 그라운드를 누벼서 붙은 것 같다"라고 선수시절 옛 별명을 돌아봤다.
두 별명이 최 감독의 플레이 모습을 담은 것이라면 거북이와 자라는 생김새로 압축된다. 목을 쭉 빼고 서 있는 모습이 거북이나 자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꾸라꾸라는 무슨 뜻일까? 최 감독과 국가대표 생활을 같이했던 최순호 전 강원FC 감독에 따르면 "베트남인지 태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남아 원정 경기에 가서 이태호, 최강희와 놀러 나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순간 (최)강희를 보니 목을 쭉 뺀 것이 자라같더라. 자라가 목을 뺄 때 내는 소리가 '꾸룩꾸룩'처럼 들려서 꾸라꾸라로 붙였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별명 모르는 사람들 많다. 비밀로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 감독과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꾸라꾸라'에 대해 들은 얘기를 전해주자 "그거 축구계 선후배들 다 알고 있는데 뭘"이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본인의 생김새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최 감독은 친화력이 뛰어나다.

봉동이장의 선수 다루는 법
올 시즌 전북의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요인 중 '더블스쿼드'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주전과 비주전 중 어느 한 쪽에서 파열음이 나오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 한 팀의 더블스쿼드다.
비주전급의 A선수는 "밖에서 보기에는 더블스쿼드라는 말이 있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하는 단어다. 중요한 경기에서는 주전급이 나서지 않느냐. 그렇다고 내 실력이 그들보다 못 미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적 선수가 많지 않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감독님이 그만큼 선수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다. 멍 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와서 '뭐 해'라고 말하고 가면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독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란다"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이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최 감독도 후보급 선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편이다. 그 역시 거칠게 축구 인생을 살아와 이들의 심정을 잘 안다. 최 감독은 "버려진 선수들이나 벤치 멤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 귀중한 아들들 아니냐. 코치들에게도 가족들보다 우리끼리 더 많이 있으니 더 잘해주자고 강조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최 감독은 선수를 믿는 편이다. 슬럼프에 빠져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게 내버려두는 편이다. 옆에서 절대로 참견하지 않는다. 괜한 소리를 했다가 선수가 감독의 말 한 마디를 계속 생각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감독의 지도 스타일을 크게 정리하면 ▲잔소리하지 않는다 ▲강제로 훈련하지 않는다 ▲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전적으로 선수를 믿는다, 네 가지로 압축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동국이다. 2009년 전북으로 온 이동국의 얼굴에는 독기가 서려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에서 실패를 맛본 뒤 성남 일화로 돌아와 그저그런 선수로 전락해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최 감독은 이동국과 자주 미팅을 갖고 힘을 불어넣었다. 그 해 이동국은 득점왕에 오르며 기력을 회복했다. 이후 지금껏 그와는 집중 미팅을 해본 적이 없다.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안다는 게 최 감독의 지론이다.
올 시즌 경남FC와 부산 아이파크에서 영입한 김동찬과 이승현에게도 딱 한 마디씩만 했다. 브라질 전지훈련에서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개조하는데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즌 개막이 되자 현실이 됐다. 오죽하면 이승현에게 "신문 보다가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 미사일 떨어지네. 하고 다시 신문을 볼 녀석이다"라며 너무 낙천적인 성격에 우려를 표시했다. 자신의 기량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깨우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6라운드 광주FC전을 앞두고 이들 둘을 호출한 최 감독은 "광주전에서는 수비하지 마라. 너희는 공격적으로 나무랄 곳이 없는 선수들이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줬다. 신기하게도 김동찬은 광주전을 시작으로 네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이승현은 데뷔골과 함께 2개의 도움을 해냈다.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한 감독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최 감독은 "다 내가 데려온 선수들인데 믿어야 하지 않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이들이다"라며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③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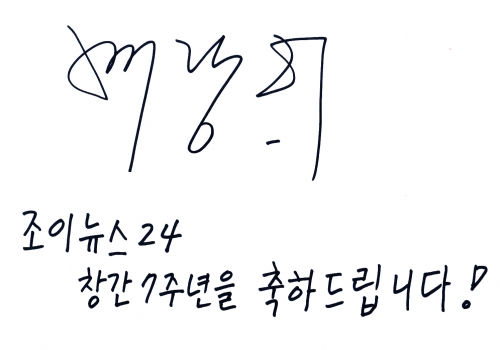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